[2021 성노동 프로젝트 제 5회] 코토 : 돌연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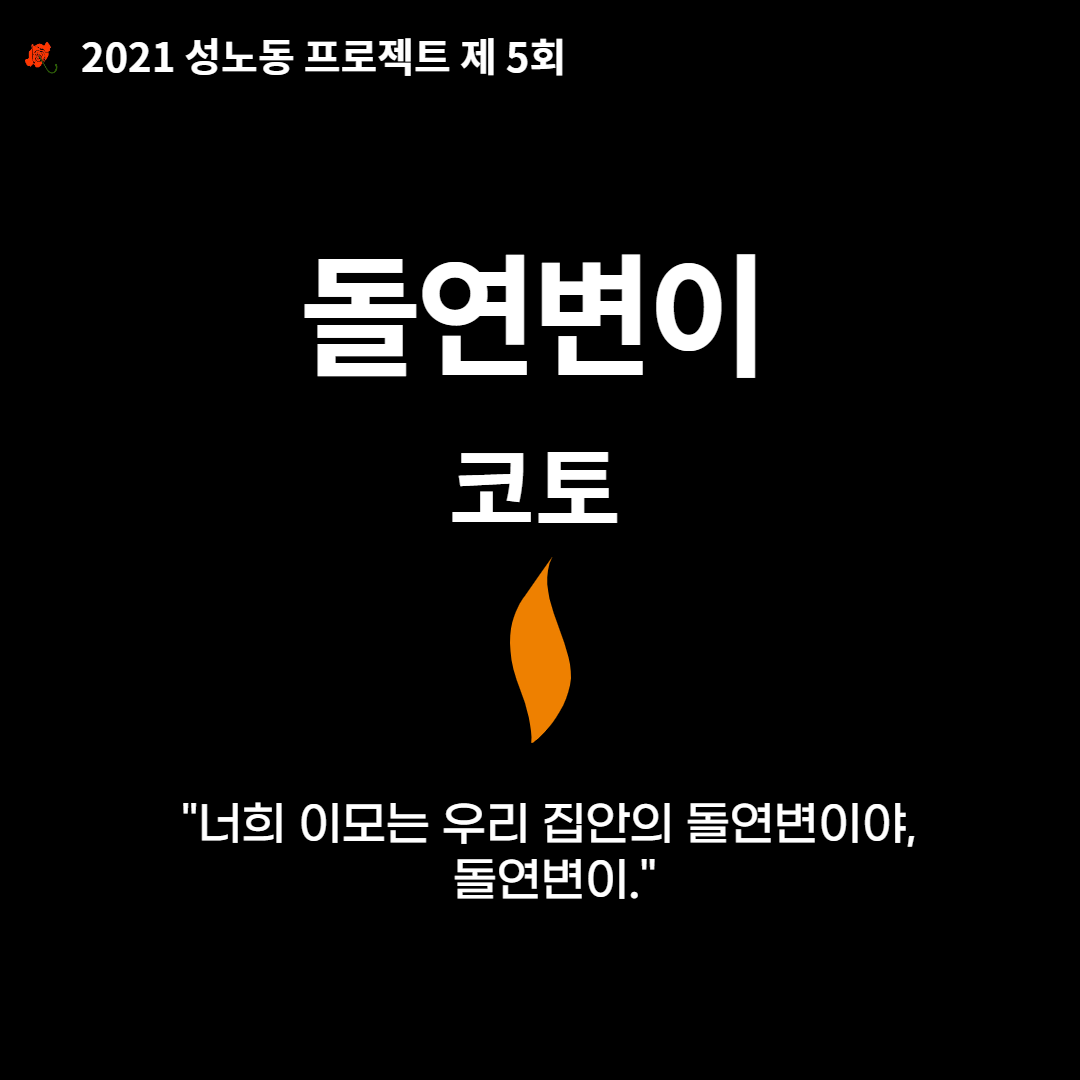
돌연변이
코토
“너희 이모는 우리 집안의 돌연변이야, 돌연변이.”
저 몸뚱이를 봐라, 다들 말랐는데 이모만 저리 펑퍼짐하잖니. 엄마는 혀를 끌끌 차며 말했다.
실존하는 사람에게 저 단어를 붙인 것도 충격이었다. 말을 내뱉은 사람이 나의 모친이고, 내가 이런 사람 아래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에 약간의 절망감까지 느껴졌다. 반면에 사실 조금 안도하기도 했다. 나는 통통했기 때문이다. 이모는 뚱뚱했고. 이모가 없으면 내가 타깃이 되기도 했다. 우리 집 여자들의 서열은 그렇게 정해졌다. 누가 말랐고 살쪘냐는 기준에 따라서 모욕을 하거나 칭찬을 듣곤 했다.
어른들은 피부가 하얗고 애교 있는 깡마른 여자아이가 뿅 하고 나타났으면 하는 눈치였다. “무릇 여자아이란 애교가 있어야지, 피부가 까매서 어떡하니.”라고 하거나 다이어트 방법을 알려주곤 했다. 애석하게도 나는 무뚝뚝하고 피부가 좋지 않은 소아비만인 어린이였으며 아마도 이 존재 자체로 트러블이었을 거라 생각한다. 돌연변이. 그 생소함 안에서도 불안감과 불쾌감이 스멀스멀 올라오던 단어. 나는 돌연변이가 될 수 없어서 망가진 신체를 붙잡고 체중을 감량하기 시작했다. 인터넷에서 초절식 다이어트 식단을 프린트해 오면 엄마는 “네가 드디어 살 뺄 생각이 들었구나. 대견하다.” 며 칭찬을 해줬다. 밥을 반 이상 남기면 주변에 자랑해댔다. 그렇게 대략 열 한 살 때쯤 부터 식이장애 비슷한 걸 겪었다고 생각한다. 당시 소화기관 장애로 인해 입원을 반복했어서 구토는 하기 싫었고, 음식을 씹고 뱉는다거나 이따금 먹지 못하는 음식을 난도질해서 변기에 버릴 때는 묘한 쾌감마저 들었었다. 잘 먹으면서 감량했으면 좋겠는지 삼겹살이나 빵을 사 오곤 했는데 내게 그것들은 혐오이자 공포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살을 빼고 들었던 첫 마디는 “여자애 배가 남산만 해서 걱정했었는데, 이제 좀 괜찮아졌네.” 였다.
답답하게도 듣고 열받기보다 “이제 돌연변이는 이모뿐이야.” 하며 안심했다. 나도 우리 집안 여자의 일원이 된 것이다. 드디어.
*
성인이 되고 나서.
바뀔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외형만 조금 줄어들었을 뿐이지 “돌연변이 같은” 행동은 여전했다. 외형이 바뀌면 마법처럼 내 내면도 전부 싹 갈아 엎어질 줄 알았는데 대단한 착각이었다.
나는 그대로였다. 집 냉장고에 육류라도 있는 날엔 먹고 싶어 굽다가도 조각조각 잘라서 버리거나 칼로 찔렀다. 빵이나 과자류는 손으로 뭉개거나 가루를 냈다. 음식은 말도 못 하고 나보다 약한 존재니까. 음식을 통제할 때마다 쾌감을 느끼는 것은 뚱뚱할 때나 날씬할 때나 변하지 않아 절망스러웠다. 좀 정신병 같다고 느꼈다. 무엇보다 괴롭히고 싶어서 안달 난(몰두한) 상태가 너무 싫었다. 모든 것은 내 관할 아래 있어야 했다. 나의 감정도 식욕도 음식에 휘둘리는 날이면 신경질적으로 변했었다. 살이 당장 5kg은 찔 거 같고, 부종이 오는 느낌이 불안해서 몸을 마구 때렸다(모친에게 자해흔을 들킨 이후로 뭐만 하면 “또 자해할 거니? 응?” 같은 소리를 몇 번씩 들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자해가 필요했다). 어느 정도 화가 풀리면 집에서 1시간 40분에서 2시간 정도 유산소 운동을 했다. 신경을 거슬리지 않으려면 어느 정도 규칙이 있어야 했는데, 일반식은 되도록 일주일에 한 번 먹고 그게 안 되면 3일이라도 텀을 두기, 급식은 무조건 반만 먹고 나머지 시간에 걷기, 학원 끝나고 배고프면 두유 한 팩 먹기 등이 있었다.
내 생활이 죄다 다이어트에 몰려있었다. 남들은 이거 하면서 저것도 하고 미래 계획을 착착 진행해 나가는 데 비해 나는 몸뚱이의 살만 바라봤다. 그래서 결국 다이어트에 성공했냐고 묻는다면, 아니. 10년을 해서 실패했다. 생전 처음 보는 몸무게와 생활하기란 그렇게 쉽지 않다. 씻는 것조차도 버거워서 헉헉대고, 거울을 보기 싫어서 꼼꼼히 씻지 못하고. 난 다시 돌연변이가 된 것이다. 인생이 망한 거 같고 짙은 패배감이 들었다. 이제 난 다시 친척 집에 가면 살 얘기를 들어야 하고, “누가 이모를 닮았나 했더니 너구나” 같은 소리가 들릴 것 같아서 불안해졌다. 이모가 성노동을 했다는 것도, 춤추는 걸 좋아하는 것도 나와 겹치는데 비만이기까지 하다면 “돌연변이 취급을 제대로 받겠지”란 생각에 어딘가로 도망치고 싶어졌다. 성노동 낙인보다 비만으로 낙인찍히는 게 더 무서웠다. 엄마는 비만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하지 않지만 내가 조금이라도 살이 빠진 것 같은 날엔 놓치지 않고 빠졌다고 칭찬해준다.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지 아마 모를 것이다.
여전히 돌연변이가 된 나의 몸을 사랑하지 않는다. 지금도 과거 사진을 보며 날씬했던 때를 그리워한다. 독특한 옷들을 보며 언젠가 입어야지 한다.
다만 돌연변이라는 단어를 좋아한다. 인생이 망한다는 기준도 생각해보면 딱히 없었고, 패배감이 들 필요는 더욱 없었다. 몸이 변한 건 변한 대로 살면 됐다. 죽지만 않으면 어떻게든 약을 먹으면서라도 살면 그만이다. 이모에게 나를 투영하기를 멈추려고 부단히 노력했다. 그 지긋지긋한 집단에서 튕겨져 나와 바라본 풍경을 사랑하게 됐다. 그게 어디인가는 중요하지 않아. 우리 집안의 모난 돌이 된 이상 살을 빼도, 빼지 않아도 계속 돌연변이일 것이다. 그러니까, 새벽마다 툭 튀어나오는 죽음과 씨름하듯이. 그것은 내게 항상 삶을 끝내도 괜찮다고 한다. 그럼 약을 과복용 해서라도 그것을 멈추게 만든다. 나는 이걸 치열하게 살아간다고 표현하고 싶다. 죽음이 항상 내 곁을 맴돌아도 나는 어떻게든 살아갈 것이다. 어쨌든 모두 내가 가는 곳이고 밖의 세상에서도 사람들은 살아간다. 각자의 또 다른 공간 안에서 치열하게, 다양하게. 자신들의 조각을 맞춰가며.
작가 소개글 : 성노동을 1년 반 정도 하고 휴직중인 성노동자. 최근엔 비건이 되었습니다. 스스로를 미친여자라고 칭하고, 모두를 존중하며 숨쉬려고 노력 중.